
바닷가 3층짜리 수협 건물 옥상에 올랐다. 모슬포, 동네 이름이 생긴 유래처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사람이 살기에는 몹쓸 곳인가. 건물은 모두 시멘트로 단단해 보이지만 오로지 바람만을 막기 위해 지어진 창고 같아 도대체가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았고 바다의 정취, 시골의 정경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마을이 내려다보였다. 멀리 보이는 오름의 젖가슴같이 부드러운 능선이 참으로 아름답지만, 시멘트 인공물에 얹어진 오름 지붕은 싸구려 브래지어가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마당 빨랫줄에 부끄럼 없이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다.
마침 섬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배가 있었다. 마라도나 가파도에서 떠나왔을 배에 내가 타고 있었다. 그 배는 여객선이 아니었다. 나무들로 얼기설기 묶어 바다에 뜰 수 있을 정도의 배, 테우1)였다. 그곳에 내가 실려 모슬포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십수 년 만의 귀항이었다. 난바다2) 항해 중 조난을 당해 외딴 섬, 무인도에서 홀로 두려워하고 혼자 방황하고 낙담하며, 또 벗어나고자 안간힘 몸부림에 소진되어 버린 십수 년. 처음부터 희망이 좌초한 것은 아니었다. 항해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처럼 원대했다. 분명한 뜻이 있었기에 돛을 달 수가 있었다. 꿈의 크기에 맞춰 띄울 곳도 정해졌다. 연못, 호수, 강, 바다...
내가 떠난 곳은 대양이었다. 돛 역시 마찬가지였다. 크기만큼이나 장애물이 많았고 저항도 그만큼 거셌다. 그러나 순항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순순한 대양의 바람을 타고 거침없을 것 같은 항해를 맛보기도 했다. 사방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의 순조로운 항해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더 큰 자신감을 붙였고 더 큰 꿈으로 부풀어 올랐다. 무한할 것 같던 꿈은 당장 눈 밑 물속의 암초를 못 보게 했다. 자신감은 자만이었고 오기는 오만이었다. 쌍안경을 보며 걷는 것과 같았다. 더 크게 보이는 망원렌즈로만 세상에 다가갔다. 절망은 역시 희망의 크기와 비례했다. 빠져서 갇혀 있던 시간도 희망의 크기만큼이나 길었다. 갇힌 시간이 길어지고 더 포기할 것도 없다 싶으니 외딴 섬도 살만했다. 체념도 자주 하니 적응이 되었고, 안이하더라도 타협하니 안주하게도 되었다.
88만 원이면 어떠랴. 떠나온 대양에 무인도는 내가 있던 그 하나만이 아니었다. 다도해보다 더 많은 홀로 뜬 무수한 섬들을 바라보며 안위할 수 있었고 홀로 된 섬들의 군락은 꿈 없이도 살 수 있고, 꿈 버리고도 즐길 수 있는 오락실 같았고, PC방 같았고, 사법행정고시를 준비하지 않아도 고시텔에서도 잘 수 있었다. 찜질방으로, 1박 2일로 그들의 놀이에 희희낙락 웃으며 시간을 때우고 메우는 TV 앞이면 족했다. 꿈은 이루어진다, 휩쓸려 함께 환호성을 지르다 보면 16강, 8강에 내 꿈도 이뤄지는 듯했고 이렇게 살아도 난바다로의 항해보다 오히려 덜 고립된 기분에 덜 쓸쓸했다. 꿈은 무인도에 맞춰지고 있었다. 희망은 좌초하지 않았고 자초하며 내게서 물러났을 뿐이다. 하지만 TV나 정치가 웃겨주면 좀 웃을까, 내 스스로 웃는 일이 적어지고 가슴이 결코 흥겹지 못해 더 심해지는 허전함, 허탈감이 때로는 항해를 위해 돛을 달았던 가슴이 떨리던 그때를 몹시도 그립게 했다. 이럴 때면 바다를 본다.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꿈이다. 꿈의 시작은 바라보는 것이지 않은가.
조밀하고 조악한 모슬포 포구도 조금 눈을 들면 한없이 펼쳐진 대양을 보듬고 있고 대양의 품에 안겨 있었다. 조금만 눈을 치켜들면.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잃고 잊었던 대양에서 나의 난파선이 좁은 모슬포항으로 흘러들어올 때 나는 절망보다는 가슴 쩟쩟한 벅참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난파선이 끌고 오는 대양을 보았고 다시 시작할 새로움을 밀치고 나아가는 난파선을 보았기 때문이다.
조러조러하고 조만조만한 모슬포 포구가 보잘것없어 뵈는 테우 한 척을 안아주고 있다. 아버지처럼. 봉곳봉곳한 젖가슴의 오름들도 너절너절해진 좌초된 희망을 품어주고 있다. 어머니처럼. 꿈은 깨져도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늘 품에 품고 기다려주는 게 꿈이었다.
돌아온 모슬포가 참 아름답다. 그리고 싶어! 십수 년 처박아둔 화구를 꺼내본다. 십수 년 가둬둔 꿈이 되살아난다. 이제 진짜 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나는 외쳤다. 변덕스러운 마음이 모슬포에서 그를 만나면 하겠다던 첫 마디 인사를 바꾼다.
“나,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1. 제주시에서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자리돔을 잡거나 낚시질, 해초 채취 등을 할 때 사용했던 통나무배.
2. 육지로 둘러싸이지 않은 멀리 떨어진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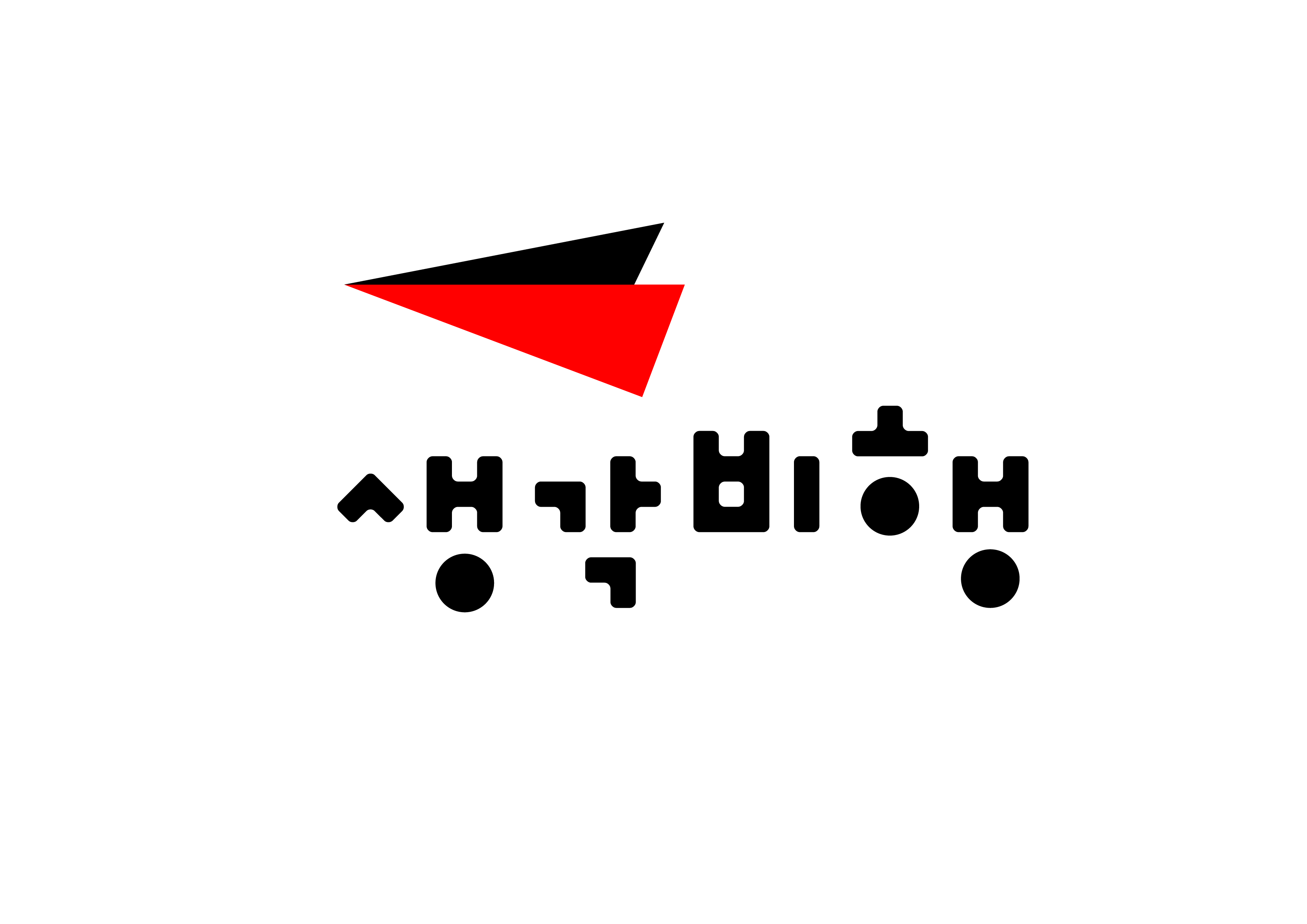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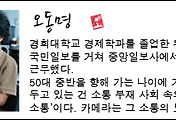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