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과 육지가 더 가까워졌다. 물론 비행기가 빠르긴 하지만 하늘을 날지 않고 바다를 건너는 길이 하나 더 생겼다. 7개월 가까이 섬에 갇혀 있다 보니 (마음으로) 육지가 그리웠다. 그래서 떠난 육지행. 이번엔 새로 생긴 바닷길을 택했다.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전남 장흥 노력항을 오가는 배는 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단다. 더구나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이 길을 쫓아가 봤다. 무척 바람이 세던 날, 전화로 문의하니 배는 뜰 거란다. 버스를 타고 성산포항에 도착했다. 배는 무척 작아 보였고, 바람에 출렁이는 모습이 60여 킬로그램인 내 몸 흔들리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작아 보이는 이 배엔 사람 270여 명에 승용차도 무려 70대나 실을 수가 있단다.
육지와의 최단거리라는 이 코스는 이미 오래전,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야 할 이들의 행로이기도 했다. 더 작은 배로 남해를 넘으려다가 송시열 같은 분은 보길도에 머물러야 했고, 세상 다 떠나 고향 해남으로 내려왔다는 윤선도 같은 분도 제주도로 향하다가 역시 보길도에서 머물러 세연정(洗然亭)을 남겼다. 건너기 쉽지 않던 바닷길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흡족해하며 배에 올랐다.
나이가 들어서일 테지만 생전 멀미 안 하던 몸이 배를 타자마자 멀미가 인다. 아이들은 마치 롤러코스터라도 탄 듯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다. 배의 가운데 자리가 흔들림이 좀 덜하다는 소리를 엿듣고 염치불고하고 자리를 옮겼다. 눈을 감고 방위 근무 때처럼 시간만 가라, 주문을 왼다. 출발하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출렁임이 잦아들었다. 육지와 섬이 이렇게 차이가 크단 말인가. 하지만 더 놀란 건, 바다색이었다. 청정바다라는 남해건만 제주도 앞바다에 비하면 구정물 같았다.
나는 제주도에 1년 반 정도를 살면서 실망이 컸다. 좋을 것 같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기후도 생각보다 여의치 않았고, 습기와 곰팡이로 거의 1년 내내 힘들었다. 이래서 다시 육지행을 고려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육지로 넘어와 그렇게도 타고 싶던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이제 제주도를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당위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의 구속이었다. 제주도가 좋다며 다 물리고 들어오려는 이들을 말릴 심산으로 나부터 만나 내 말 듣고 오라 했지만, 이제는 다른 얘길 해줄 것 같다. ‘그래도 이만한 곳이 우리나라에 있나?’
하지만 역시 사람 사는 동네인지라 사람이 문제다. 자연은 그지없이 세계 제일로 꼽고 싶건만... 아쉽다. 역시 사람이 문제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던가.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그건 단지 시에서나 글 따위에서나 노래에서나 할 짓거리다. 희망 사항일 뿐이다. 문학 언어의 현혹에 불과하며 유곽의 호객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어디나 사람이 문제다.
제주도로 넘어오려는 이에게 그동안 “제주도는 3박 4일용 관광지일 뿐이다”라고 말했던 나는, 이제 사람을 조심하면 제주도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말하련다. 그러나 이 말은 역시 오지 말라는 말과 같을 수가 있다.
제주도에 산다 하면 다들 처음으로 하는 말, “좋겠다. 나도 거기서 살고 싶은데...” 제주도의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고 길지 않은 동선이지만 멋진 곳을 많은 건 사실이다. 아무리 멋지다는 미국땅, 별것 다 있다는 중국땅도 관광지를 옮겨 가려면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 작은 곳에 멋진 풍광이 몰려 있어 이만한 자연박물관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그러나 문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다. 이게 문제다.
올레길이 유행을 타자 올레길을 만들었다는 집단이 길을 넓히며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그는, 스페인인가 하는 곳의 몇백 년 그대로의 길, 산티아고를 보고 고향에 길을 텄다. 하지만 산티아고가 올레길처럼 사람이 손을 댔던가? 사단법인 같은 걸 만들어 자연스러움을 깨는 데 개입하고 있는가? 보았다는, 그래서 그 길처럼 만들고 싶었다는 그에게 묻고 싶다.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다. 문제는 또 있다. 떼로 몰려다니는 여행자들이다. 그리고 제주도로 거처를 옮기려면 겪어야 할 집과 연관된 사람들의 개입이다. 무지 조심해야 한다. 옮겨 온 사람치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무엇보다도 나처럼 쉽게 생각하고 들어온 가벼움이 더 문제다.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육지보다 싼 듯한 집이나 땅에 쉽게 마음을 굳히며 옮겨오려는 이들의 가벼운 결정이 문제라는 얘기다.
섬에서 육지를 2시간 만에 왕래하는 배를 타고 가면서, 아주 좋은 제주도와 너무 아쉬운 제주도를 멀미하듯 이리저리 왔다갔다 출렁거려본다. 오렌지호라는 이름이 붙은 배로 향하는 사람들이 모두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는 듯했다. 내 마음이 잠시 감귤색인 오렌지색으로 물든다. 떠들고 담배 피우고 침 뱉는 이들에게서 어린이 같은 오렌지 마음을 기대해본다.
5월이 깊어지면 제주도, 특히 서귀포 쪽 남단 제주도는 감귤꽃 단내나는 향기로 공기가 한층 신선해진다. 5월이 되면 육지보다 제주도는 어린이 마음을 하나 더 선물 받는다. 나는 제주도로 옮겨와 작년에 처음 이 감귤꽃 내를 맡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른다. 제주도의 11월이 감귤이 열려 시각적 낙원이라면, 그 꽃이 피는 5월은 후각적 낙원이 된다. 제주도의 자연은 탓할 무엇 하나 없이 곱고 아름답다. 하지만 지금도 제주도는 인간의 손에 의해, 발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세연정 (출처 : 두산 엔사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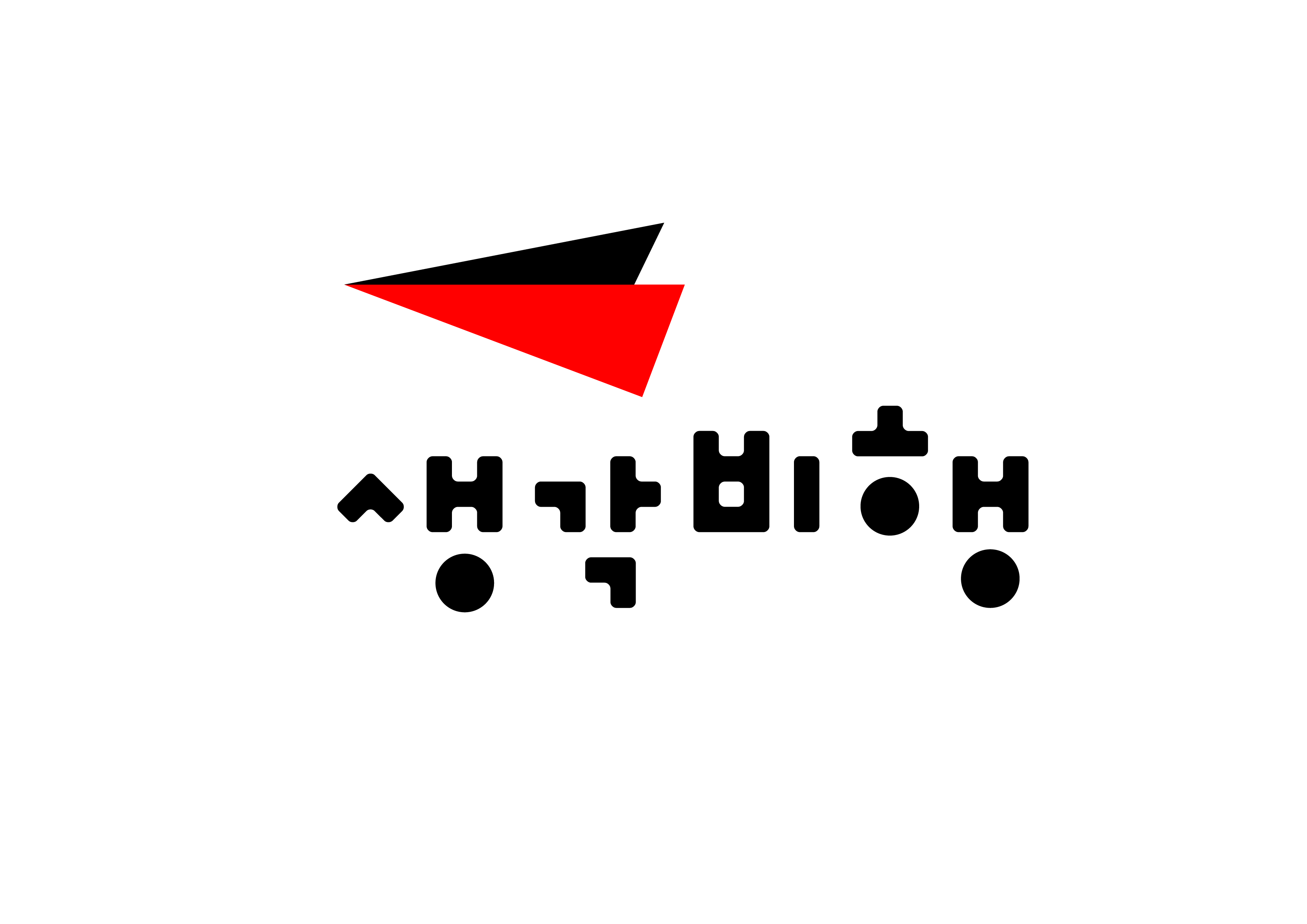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