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쑤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떡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사람들은 자신과 익숙하지 않은 존재나 일에 대해 배타적일 때가 잦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틀린 게 아닌데도 무조건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참 속 좁은 행동입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시 서두를 보면 기형도 시인은 아마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동네 목사에 관해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찬송하는 법도 없어/교인들은 주일마다 쑤군거렸다”는 걸로 봐서 그 동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부르는 데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시인이 동네에서 흔히 보던 광경이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철공소 앞에서 만난 목사는 동네 교회 교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이어서 시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기형도 시인의 눈에 비친 동네 교인들은 신에게 복을 구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했겠죠.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는 표현을 보면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생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더욱 필요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저 자기 삶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을 때, 아마도 교인들은 안수기도나 영적 능력을 통해 병을 고치지 못하는 목사에 대한 신뢰를 거뒀는지도 모릅니다. 신기를 잃은 무당을 찾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인 중에 반이 장마통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은 교인이라고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목사의 말에 교회 집사들은 분노합니다. 신앙을 생활에서 표현해야 한다는 기본을 말한 것뿐이지만, 집사들은 목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고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목사의 올바른 설교가 싫었을 뿐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에서 떠나야 할 사람은 목사뿐이었습니다. 집사들의 계략이 시의 행간을 채웁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고개를 끄떡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에서 새로운 목사를 세우고 기득권을 누리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집사들의 계략이 성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유대인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기형도 시인은 동네 교회 목사를 교회가 아닌 철공소 앞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목사에 관한 주변의 정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한참 보다가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목사의 모습을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기형도 시인은 신앙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목사와 그를 향해 수군대는 교인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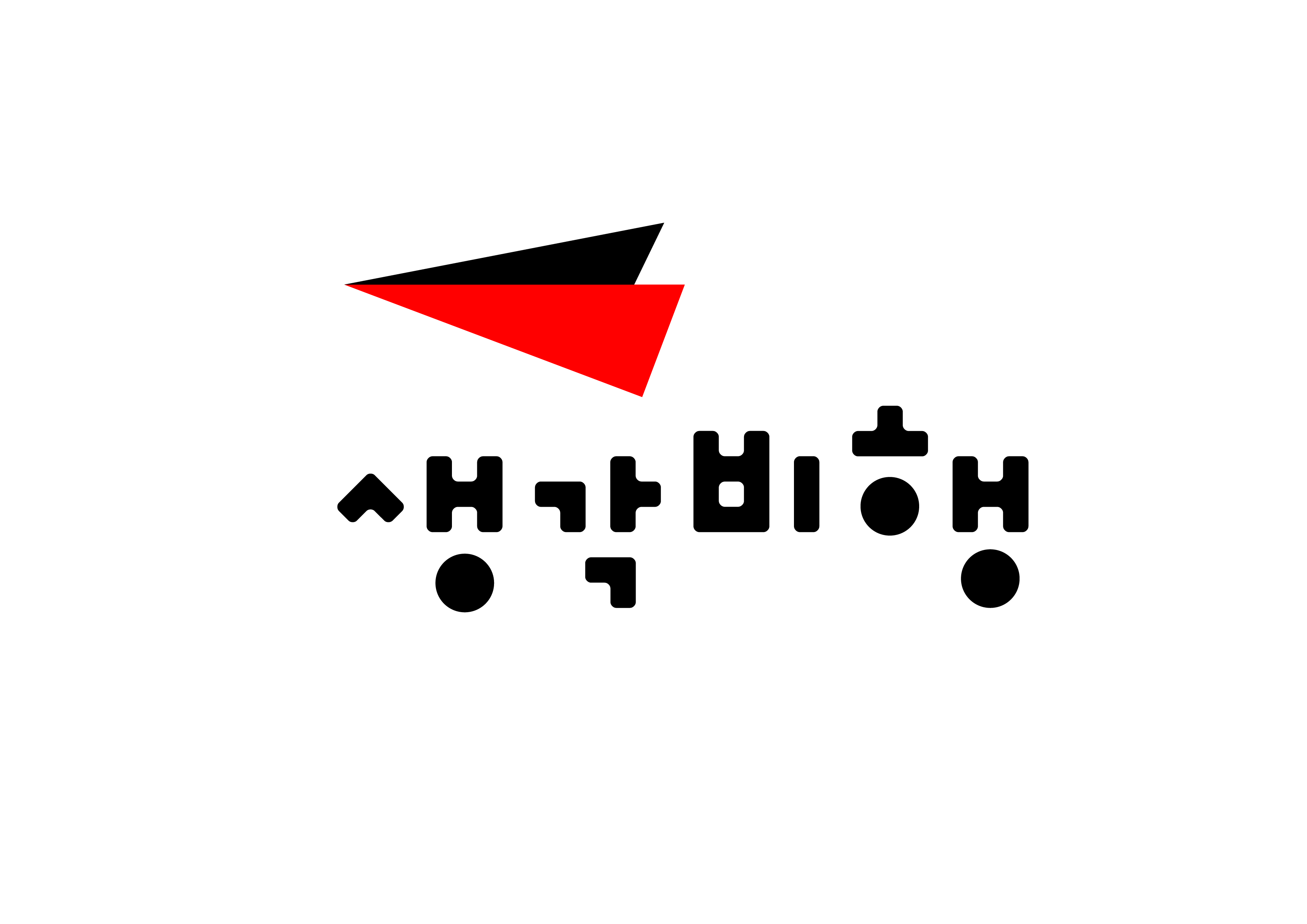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