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낸 가을, 유난히 고향이 그립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에게 시골의 고향은 그림이나 영화 또는 여행에서 본 인상적인 장면처럼 아련하기만 합니다. 방학 때 친척을 찾아 시골에서 논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향 하면 앞에 강이나 바다가 있고 뒤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할 〈참깨를 털면서〉라는 시를 쓴 김준태 시인은 전라남도 해남 출신입니다. 그는 "살구꽃이 피고, 보리꽃이 피고, 봄마다 뜸북새가 울고, 여름마다 물꼬싸움이 찾아들고, 매미가 울고, 가을엔 저녁노을처럼 들기러기가 내려앉는 곳. 뿐이랴, 논밭들이 헐떡거리는 들판 건너 바다도 보이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이다" 하고 자신의 고향을 소개합니다.
시인의 말마따나 고향은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편안함을 주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장 일변도인 정부와 지자체의 개발 논리 앞에서 전국의 고향은 위태롭습니다. 댐을 만들어 수몰되거나, 공장이 들어선다고 파헤쳐지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거나, 항구를 만든다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산과 들과 강과 해변이 추억으로만 남을 위기에 처한 곳도 많습니다. 4대강 공사로, 해군기지 건설로, 간척사업 등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우리의 고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그늘 내린 밭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어
솨아솨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都市에서 십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번만 기분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솨아솨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시인은 도시생활에서 돌아와 오랜만에 참깨를 터는 작업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都市에서 십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기가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라고 심경을 직접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휘파람불며 참깨를 털어내는 손자에게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되느니라” 하며 가볍게 일러주십니다.
‘참깨 털기’가 도시생활에 익숙한 손자에게는 큰 즐거움이겠지만, 할머니에게는 해마다 돌아오는 일상생활입니다.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며 참깨를 텁니다. 깨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젊은 손자는 해지기 전에 집에 가려고 빨리 털어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선지 할머니는 귀여운 손자에게 가벼운 꾸중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흔합니다.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농촌의 삶을 막연히 즐겁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조선 시대 윤선도처럼 가난하지만 낭만적인 생활을 하고 왔다는 식으로 농촌생활을 '쉼'과 '재미'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윤선도가 자연과 어촌의 평화로운 풍경을 노래하며 즐기는 동안 보길도 주민은 일상의 힘겨움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체험'을 하러 내려가는 사람들에겐 그곳의 일상이 재미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논밭에서 땀 흘리는 현지인들로서는 일상을 재미로 국한하여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젊은 손자의 모습과 농촌을 문화체험의 현장 정도로 생각하는 요즘 도시인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몇 주먹 더 털어놓자면, 사람들아, 나의 고향은 나의 宇宙다. 나의 고향은 나의 敎科書요, 바이블이요, 눈알이요, 망원렌즈요, 배꼽이요, 귓구멍이요, 속옷이요, 머슴이요, 스승이요, 보리밥이요, 天國이요, 개똥이요, 구정물통이다. 요컨대 나의 고향은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未來다.
글을 마무리하며 《참깨를 털면서》의 발문을 쓴 조태일 시인과 천상병 시인의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조태일은 김준태의 시를 읽고 자신보다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보내온 약력을 보고 대학교 초년생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 뒤 김준태는 중앙의 발표지면을 통해 좋은 시를 맹렬히 발표합니다. 하루는 《창작과비평》에 실린 김준태의 <감꽃> 등의 시를 읽고 천상병 시인이 조태일 시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셌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대낮부터 청진동 막걸릿집으로 조태일을 데려간 천상병 시인은 백 원어치의 막걸리를 이 세상에서 남에게 사는 처음이자 마지막 술이라며 권했다고 합니다. 김준태의 좋은 시를 읽고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옛동무를 만나 고향의 추억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948년 해남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과를 졸업했다. 1969년 월간 《시인》지로 등단했다. 베트남전쟁에 1년 동안 참전했으며 13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11년간 전남일보, 광주매일 편집국, PBC광주평화방송 시사자키, 5·18구속자 회장,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한국문학평화포럼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조선대학교 문창과 초빙교수로, 광주 금란로에 작은 학교 <금남로리케이온>을 마련하여 교육과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참깨를 털면서》《나는 하느님을 보았다》《국밥과 희망》《아아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칼과 흙》《지평선에 서서》, 소설 〈오르페우스는 죽지 않았다〉 외 액자소설 88편, 통일시해설집 《백두산아 훨훨 날아라》, 세계문학기행집《세계문학의 거장을 만나다》, 평전《명노근 평전》 베트남전쟁소설《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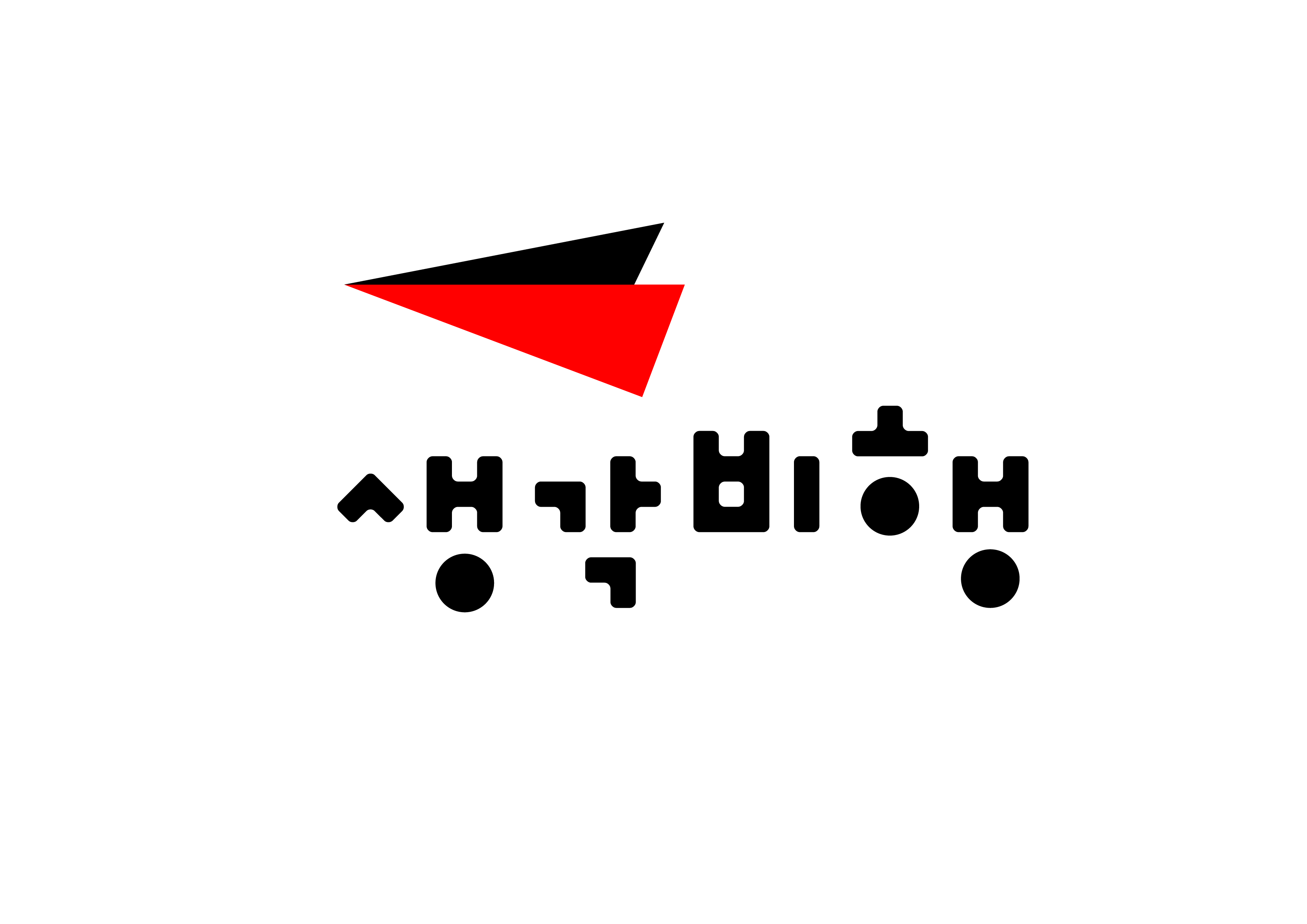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