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생각비행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시비(詩碑)를 찾아서〉를 연재하겠습니다. 무심코 지나는 길가나 공원에 세워진 시비를 찾아 걸음을 멈추고 비(碑)에 새겨진 시를 읽겠습니다. 시인의 삶을 엿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
봄 길목에 선 3월, 청운동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 있는 시비(詩碑)를 보기 위해 안산(연세대학교 뒷산) 둘레길을 걸었다. 둘레길은 무악재 하늘다리 넘어 인왕산 자락길로 이어졌다. 이 길 위에서 독립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국사당 등 일제강점기의 아픈 흔적을 만났다.
그리고 다다른 윤동주 시비.
앞에는 〈서시〉가, 뒤에는 〈슬픈 족속(族屬)〉이 시인의 글씨체로 새겨져 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를 읽을 때면 사이토우 마리코의 시 〈비 오는 날의 인사〉 중 한 구절이 생각난다.
“- 시인이 시인이라는 것만으로 학살당했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라고 일본의 한 뛰어난 여성시인이 쓴 적이 있습니다”
시인이 제 나라 말로 시를 썼다고 죽어야 하는 시대였다. 제 나라를 찾겠다며 몸부림치던 이들이 끔찍하게 죽어야 하던 시대였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외치며 피 흘리던 시대였다.
시비 뒤쪽에 보이는 광화문 빌딩숲 사이로 해방된 나라에서 독재에 항거한 외침이,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자며 촛불을 든 이들이 떠올랐다.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追憶)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시비를 지나 언덕을 내려오면 〈자화상〉을 모티브로 수도가압장과 물탱크를 활용해 조성한 윤동주문학관이 나온다.


전시실에는 간도 용정 시인의 생가에서 가져온 나무 우물이 있다. 시인은 이 우물에 비친 하늘과 구름과 바람, 자기 얼굴을 떠올리며 〈자화상〉을 썼을 것이다. 이곳엔 시인의 육필원고, 사진, 시집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옆 열린방을 통해 닫힌방에 들어가면 시인의 생애와 시를 정리한 짧은 영상을 볼 수 있다.
유학을 위해 창씨개명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쓴 시 〈참회록〉. 별을 노래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젊은 시인. 혹자는 윤동주의 시는 서정성만 있을 뿐 저항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를 저항 시인이 아니라고 한다. 일제에 저항하는 시어를 사용해야 저항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윤동주는 삶이 곧 시였던 시인이다. 우리말로 시를 쓴 것이 죄고 윤동주가 일본 감옥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다. 시인 정지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서문에 "호피는 마침내 호피에 지나지 못하고 말 것이나, 그의 '시'로써 '시인'됨을 알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썼다. 시인 윤동주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었고 그 길을 시로 옮겼다. 일제를 찬양하고, 지원병이 될 것을 독려하는 시를 쓰며 해방 후에도 부끄럼 없이 편히 살던 이들이 있다. 식민지 시대도 아닌데 이들의 시를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했던 기억이 슬프다. 별을 노래하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했던 시인 윤동주. 문학관을 돌아보는 내내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되뇌었다.
문학관을 내려와 서촌 세종마을에 들어서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곳에 연희전문 시절 윤동주 시인이 하숙하던 집터가 있다. 시인의 흔적은 없으나 벽에 붙은 동판을 통해 시인이 하숙한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시인은 〈별 헤는 밤〉, 〈참회록〉, 〈또 다른 고향〉을 썼다. 아마도 윤동주 시인은 밤마다 언덕에 올라 별을 노래하고 고향을 생각하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고민했으리라.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지금은 시를 읽지 않는 시대, 시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다. 삶이 시가 되어 별이 된 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글 한 줄에 죽어야 했던 시인과 그의 시대를 떠올리며, 시인의 나이를 두 번 넘어 버린 나에게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물으며 〈참회록〉 한 줄을 읽어준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빛나는 것 하나 없는 서울의 하늘, 안락만 좇으며,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며, 불의를 외면하며, 다음에 올 세대를 생각하지 않으며, 젊음을 낭비하며 살던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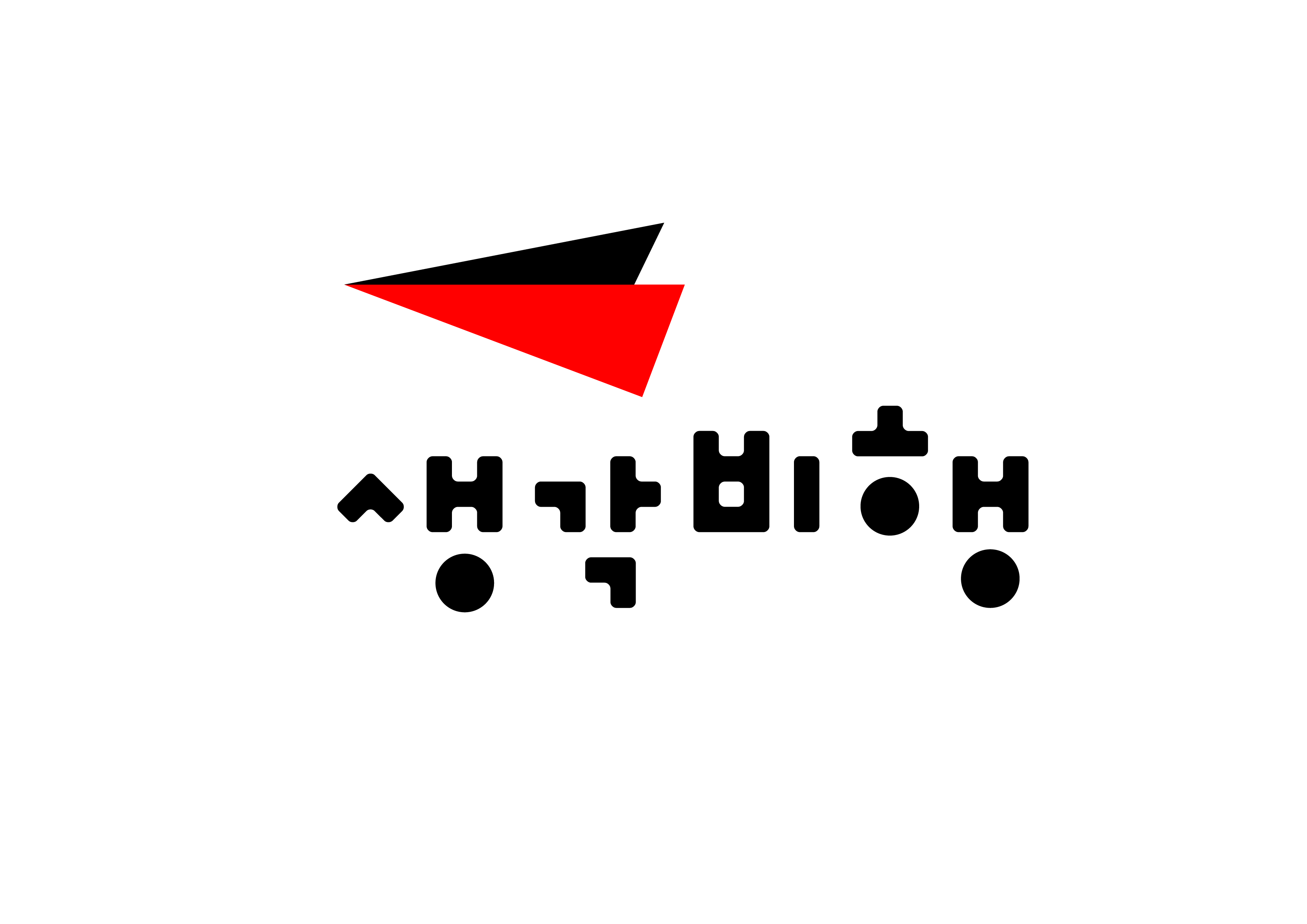
댓글